전라북도에서 유명한 고창 도솔산 선운사의 건축미, 창건 배경과 설화, 주요 전각과 불상을 통해 호남의 숨은 불교 유산을 안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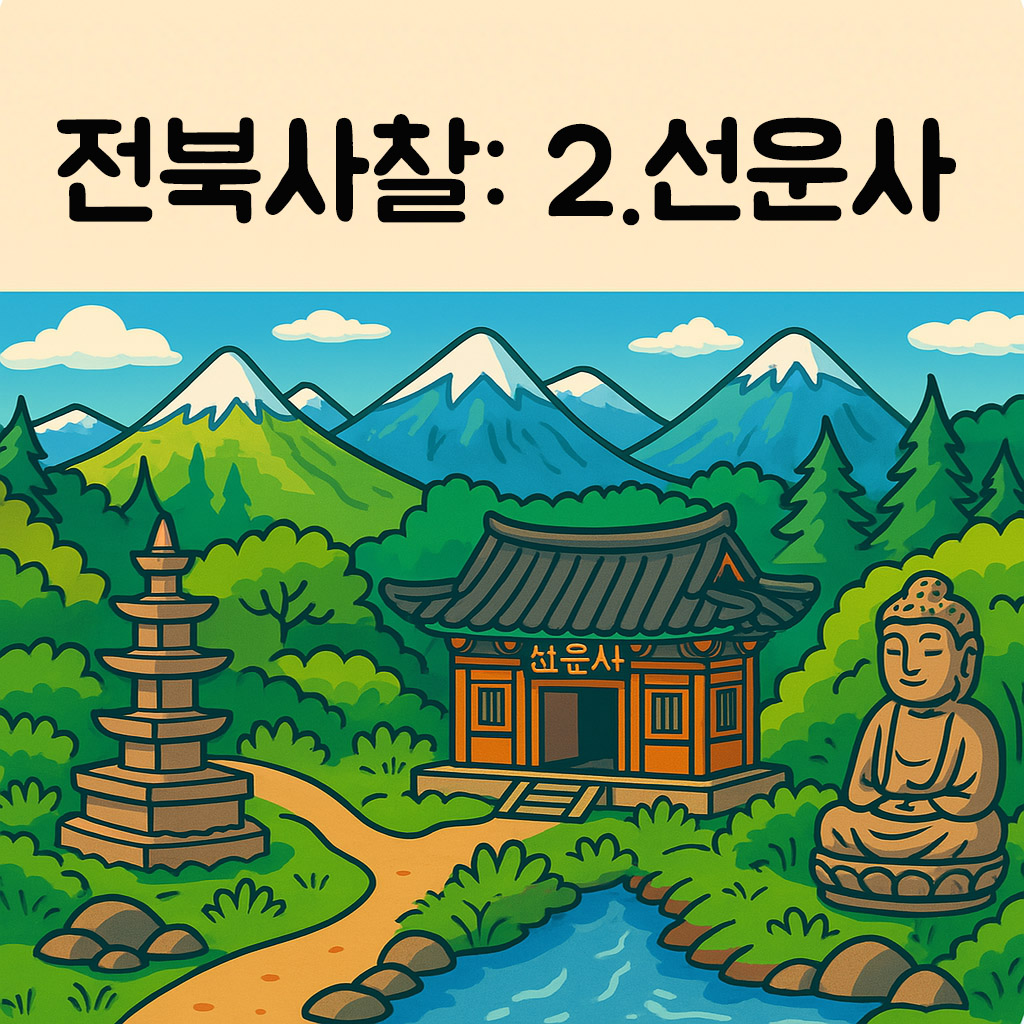
2. 선운사 (禪雲寺)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는 백제 위덕왕 24년(577년)에 검단 스님이 창건하여 도솔산 북쪽 기슭에 터를 잡은 천년고찰입니다. 고려 공민왕 3년(1354년)에 효정 선사가 중수하였고, 조선 성종 3년(1472년)부터 극유 스님이 주도 하에 10년 중창으로 재탄생하였지만, 그 웅장한 건축물들은 선조30년 정유재란 때에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광해군 때와 숙종 때 다시 중창이 이루어졌으며, 1997년에 성보박물관을 신축하는 등 선운사의 불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운사라는 이름은 “구름〔雲〕 위에서 선정〔禪〕을 닦는다”는 뜻으로, 참선와운(參禪臥雲)에서 유래했으며, 산의 원래 이름인 도솔산이 선운사로 인해 선운산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운사의 가람 배치는 도솔천을 건너 만세루와 대웅전까지 이르는 일자형 구조로, 평지 사찰에 가까우며 백제식 구조와 유사합니다. 일반적인 산지 사찰의 층층이 쌓인 배치와 달리 넓게 비워둔 마당을 두어 넉넉한 느낌을 주며, 대웅전과 주요 전각들은 낮은 비탈에 석축을 쌓아 그 위에 높이 올린 구조로, 도솔천의 맑은 물소리가 어우러진 경내가 수행 공간의 정수를 드러냅니다. 화려한 단청과 섬세한 다포계 공포 구조가 돋보이는 법당들, 절 뒷쪽 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 제184호) ㆍ장사송(천연기념물 제354호)ㆍ송악(천연기념물 제367호) 등이 유명하며, 대웅전(보물 제290호)·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 제279호)·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보물 제1200호) 등 보물도 많습니다.
◆선운사를 세운 검단선사에 대해 전해오는 설화가 있습니다. 옛 백제 시대 선운 마을은 자주 해적과 도적의 습격으로 고통받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인자하게 생긴 노인이 찾아와 주민들에게 소금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함께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마을 앞바다에 사람이 없는 배 한 척이 나타났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노인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변에 나가자 배에서 신비한 인물이 내려와 인도 공주의 부탁이라고 하며 황금 불상 두 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때 마을 연못에 살던 용이 있었는데, 노인이 용을 쫓아내고 그 못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 눈병이 돌았고, 연못에 숯을 부으면 눈병이 낫는다는 걸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숯과 돌로 연못을 메웠습니다. 마침내 노인은 연못 위에 절을 세우고, 인도 공주가 보내준 황금불상을 모셨으며, 절의 이름은 이때부터 ‘선운사(禪雲寺)’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도적이 소금을 요구하며 마을을 위협하자, 갑자기 도적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 도적들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 때 노인이 호랑이를 멈추게 하고 도적을 일깨운 뒤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검단선사(黔丹禪師)’라고 밝히고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소금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검단선사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보은염’이라 부르며 매년 선운사에 소금을 보시하였고, 마을 이름도 ‘검단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전승은 절과 마을 공동체가 불법으로 맺은 은혜와 보은의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역N문화>
◆선운사 부속암자인 도솔암으로 가는 길에 자리한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에 얽힌 설화입니다. 가슴 아래 새겨진 복장에는 비밀스러운 기록이 숨겨져 있는데, 이 기록이 알려지는 날 조선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말 전라감사 이서구가 그 기록을 꺼내 보려했는데, 갑자기 뇌성벽력이 일어나는 바람에 ‘전라감사 이서구가 열어 본다’라는 대목만 보고 도로 넣었다고 합니다. 100여 년 후 동학운동이 움트던 19세기 말에 동학 접주 손화중이 그 기록을 무사히 꺼내 가져갔다고 끝을 맺는 이야기로, 당시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농민들의 염원을 엿볼 수 있는 전설이기도 합니다.

◆주요 전각 및 불상◆
| 대웅보전 大雄寶殿 |
앞5칸·옆3칸 다포 맞배지붕; 보물290호; 중심법당; 조선중기 단층 목조건축으로, 우물천장·빗살분합문·단청 벽화가 뛰어나며, 측면에는 공포가 없는 대신 기둥 두 개를 높이 세워 대들보를 받치도록 하였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넓고 건물의 앞 뒤 폭은 오히려 좁아서 옆으로 길면서도 안정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삼존불로 비로자나불과 좌우협시 약사여래·아미타여래를 각각 불상(대형 소조비로자나불삼불좌상: 보물1752)과 후불탱화로 모시고 있습니다. [탱화(幀畵): 천이나 비단에 부처, 보살, 성현 등을 그린 불교 그림] |
| 관음전 觀音殿 |
앞옆3칸 맞배지붕; 대웅보전 뒤 동쪽 위치; 천수천안관세음보살상, 천수천암관세음 탱화, 신중 탱화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불교의 보살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보살로 자비의 보살] [보살: 보리살타의 약어로 본래의 뜻은 깨달음을 구하는 자이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단순히 깨달음을 얻은 '나라한'이 아니고 이미 깨달음을 이룬 존재라도 지상에서 윤회를 겪으며 중생구제에 힘쓰는 보살 뜻하며 관세음·지장·문수·보현보살 등이 있음] |
| 지장보궁 地藏寶宮 |
앞옆3칸 맞배지붕; 관음전 동쪽에 위치한 전각으로, 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279호)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원래 관음전에 모셨던 지장보살상을 지장보궁으로 옮겨온 것으로, 도솔암·참당암에 각각 모신 선운사 보물인 도솔암금동지장보살상(보물280호)·참당암석조지장보살상(유형문화재33호)과 더불어 선운사지장삼장(地藏三藏)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동지장보살상(金銅地藏菩薩坐像): 1936년 절도범이 훔쳐 일본에 팔았지만 일본 소유자는 꿈에 나타난 지장보살이 말한 '선운사로 돌려보내달라'는 지시를 무시했다가 집안에 불행이 끊이지 않아 결국 팔아버렸고, 이후의 소유자들에게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결국 자수하게 되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 퇴설당 동상실 능인각 |
스님들이 지내시는 요사채로 사용됩니다. |
| 산신각 山神閣 |
앞3칸·옆2칸 맞배지붕; 영산전 뒤쪽, 팔상전(八相殿) 옆에 위치; 산신을 본존으로 모신 전각이며, 불교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전해 오던 토착 신앙이 불교가 도입되면서 서로 융합되어 새롭게 산신 신앙으로 등장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만 나타나는 신앙 형태입니다. |
| 팔상전 八相殿 |
앞3칸·옆2칸 익공계 맞배지붕; 부처의 여덟 생애를 탱화로 구현한 전각으로, 현재 근래 새로 조성한 석가여래좌상이 모셔져 있으며, 1706년 중건 때 함께 봉안한 팔상 탱화가 있었으나 현존하지 않고, 현재는 1900년에 새로 조성된 팔상 탱화도 그 중 2점만 남아 있습니다. |
| 조사전 祖師殿 |
앞5칸·옆2칸 팔작지붕; 역대 조사 스님 영정을 봉안한 전각입니다. |
| 영산전 靈山殿 |
앞5칸·옆3칸 맞배지붕; 대웅보전 서쪽; 2단의 높은 축대 위에 조성된 전각으로, 원래 내부에 1장 6척이나 되는 큰 불상을 모셨기 때문에 2층 누각 건물인 장육전으로 불렸으나 1614년에 중건하면서 단층으로 바뀌었습니다. 불단에 전북 유형문화재28호인 목조삼존불상(석가여래상과 좌우협시 제화갈라보살· 미륵보살상)과 내부 좌우측에 16나한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
| 명부전 冥府殿 |
앞5칸·옆3칸 초익공 맞배지붕; 별도의 지장전과 시왕전이 합해진 전각이며, 지장보살·시왕·칠성·독성·산신을 함께 배치한 전각으로, 사후세계 관념을 집약합니다. |
| 정와 靜窩 |
주지스님이 지내시는 동상실(東上室)로, 원래 승방으로 사용되던 관음전에 붙어 있던 정와(靜窩)라는 현판을 옯겨와 붙였다고 합니다. (정와(靜窩): 고요한 처소] |
| 선불장 選佛場 |
스님이 거주하는 승당(僧堂)이나 수행하는 수행공간을 뜻합니다. |
| 항운전 香雲展 |
요사채 형태의 전각으로, 승려나 수행자가 머무는 강의 및 휴식 공간 역할을 합니다. 주로 도량의 안내·접대 기능을 수행하며, 사찰의 규모와 품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전각 중 하나입니다. |
| 범종각 梵鐘閣 |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불전사물인 대형 범종·법고·운판을 걸어 놓은 종각입니다. |
|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 보물 제1200호; 동불암지마애여래좌상(東佛庵址 磨崖如來坐像)은 도솔암 동쪽 절벽 커다란 바위벽에 새긴 마애불로, 신체 높이가 약 15.7m, 무릎 너비는 약 8.5m이며 연꽃무늬를 새긴 받침돌에 앉아 있는 모습이며, 마애불 머리 위에는 네모난 구멍들이 뚫려 있고 그 구멍에 목재가 박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은 마애불의 장엄함을 위해 설치한 닫집(법당의 부처를 모신 자리 위에 만들어 다는 집 모형)이 있었던 흔적입니다. 가슴 아래 새겨진 복장(불상(佛像)을 만들 때, 그 가슴에 금ㆍ은ㆍ칠보(七寶)와 같은 보화(寶貨)나 서책(書冊) 따위를 넣음)에는 비밀스러운 기록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애불의 양식으로 보면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통일신라 시대 석조 부조 기법을 보여 줍니다. |
| 육층석탑 | 전북유형문화재29호; 통일신라 양식의 6층 석탑으로, 균형 잡힌 비례와 단아한 조형미가 돋보입니다. |
| 원통전 圓通殿 |
1660년 창건, 1824년 중수된 앞·옆면 3칸 丁자형 전각으로, 조사 영정과 불단을 갖춘 설법 공간입니다. |
| 만세루 萬歲樓 |
앞9칸·옆2칸 일자집 익공계 맞배지붕; 보물2065호; 만세루는 본래 중층 누각형태였으나 화재로 다시 지어 단층으로 바뀌었으며 강당으로 쓰입니다. 일주문, 천왕문 다음으로, 중심법당 대웅전에 이르는 마지막 관문인 해탈문 역할을 합니다. [본래 사찰의 일주문·천왕문·해탈문 을 해탈에 이르는 삼해탈문 또는 삼문이라고 하며 대웅전 등 중심법당과 일직선으로 중심축을 이룹니다.] |
| 천왕문 天王門 |
앞3칸·옆2칸 맞배지붕; 2층 누각이었지만 현재는 단층 건물; 천왕문은 사찰의 대문역할을 하는 두 번째 삼문으로, 동서남북 수호신 사천왕상을 봉안하고 있으며, 선운사 남 증장천왕 발밑에는 악귀 대신 음녀가, 서 광목천왕 발밑에는 탐관오리가 있습니다. 원교 이광사(圓嶠 李匡師)의 친필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선운사범종: 순조 18년에 주종장 권동삼이 제작한 동종으로, 높이가 124㎝, 입지름이 93㎝,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동종 중에서는 크기가 크며, 낮지만 둥근 천판 위에는 두 마리 용이 등을 맞댄 모습의 종뉴가 있고, 전체적으로 옅은 청색을 띠고 있어 크기에 비해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
| 부도전 浮屠殿 |
스님들의 사리나 유골을 봉안한 승탑인 부도가 모여있는 곳으로, 추사 김정희의 친필이 적힌 백파율사비(전북유형문화재122호)가 있습니다. |
| 일주문 一柱門 |
기둥들이 일직선 위에 서 있다는 뜻의 일주문은 사찰 영역으로 들어서는 첫 번째 산문(山門)으로, 도량의 가장 바깥에서 사찰과 사찰이 아닌 곳의 경계를 뜻합니다. |
| 부속암자 附屬庵子(19세기 전반기까지 산내암자가 50여 곳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
도솔암(兜率庵): 선운사 등산로 2km 위, 깎아지른 절벽을 바라보는 곳에 위치한 암자로, 선운사와 함께 창건되었으며, 조선후기까지 상도솔암(上兜率庵)· 하도솔암(下兜率庵)· 북도솔암(北兜率庵)로 불리던 세 독립적인 암자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상도솔암은 지금의 도솔천 내원궁을 말하며, 하도솔암은 마애불이 있는 곳, 북도솔암은 지금의 대웅전이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문화유산으로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290호)· 도솔암나한전(전북문화재자료110호)· 도솔암내원궁(전북문화재자료125호) 등이 있습니다. |
| 참당암(懺堂庵): 선운사를 나와 오른쪽 산길로 따라가면 나오는 암자로, 승려 의운이 창건하였으며, 대참사(大懺寺) · 참당사(懺堂寺) 등으로 불렸던, 규모가 상당히 큰 사찰이었다고 합니다.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등이 있습니다. 대웅전(보물803호): 대웅전에 있던 참당암동종(전북유형문화재)은 현재 선운사성보박물관에 있습니다. 약사전: 석조지장보살좌상(石造地藏菩薩坐像: 보물2031호) |
|
| 석상암(石床庵): 선운사와 함께 창건된 암자로, 석상암이란 이름은 절의 서쪽 30m 평상처럼 생긴 넓은 바위에서 유래하였으며, 고려 중기에 수선사(修禪社) 제2세 법주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諶)이 이곳에 주석하여 「겨울 석상암에서」라는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칠성각과 인법당 등이 있으며, 문화유산으로 석상암 칠성도(전북문화재자료192호)와 산신도(전북문화재자료230호)가 있습니다. | |
| 동운암(東雲庵): 선운사 입구에 자리한 비구니 암자로, 검단선사가 선운사와 함께 창건하였으며, 석가삼존불을 봉안한 법당과 칠성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방세계(十方世界)의 여러 부처를 그린 오십삼불탱화(五十三佛幀畵)와 불교의 호법신들을 그린 신중탱화(神衆幀畵)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
◆주소: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전화번호: 063-561-1422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꼭 가봐야 할 사찰 6곳 중 고창 도솔산 선운사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불교문화포털, 국가유산포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역사문화유산, 지역N문화, 디지털인문학연구소, 불교신문, 법보신문, 네이버지식백과/사전, 위키피디아, 고창선운사홈페이지>









'정보365 > 한국사찰 탐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충청남도에서 꼭 가봐야 할 사찰 6곳: 6.관촉사 (1) | 2025.12.25 |
|---|---|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꼭 가봐야 할 사찰 6곳: 1.금산사 (3) | 2025.09.11 |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꼭 가봐야 할 사찰 6곳: 3.내소사 (0) | 2025.09.11 |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꼭 가봐야 할 사찰 6곳: 4.개암사 (0) | 2025.09.11 |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꼭 가봐야 할 사찰 6곳: 5.탑사 (0) | 2025.09.11 |



